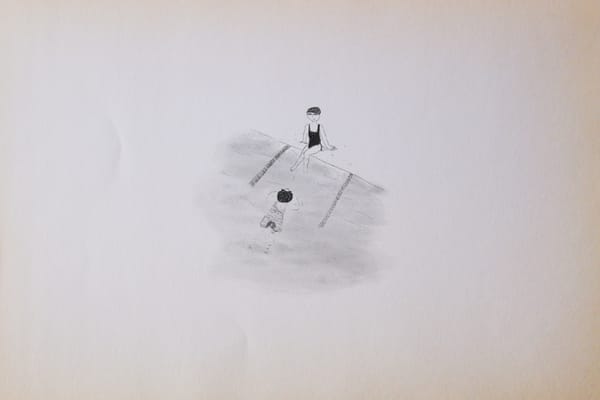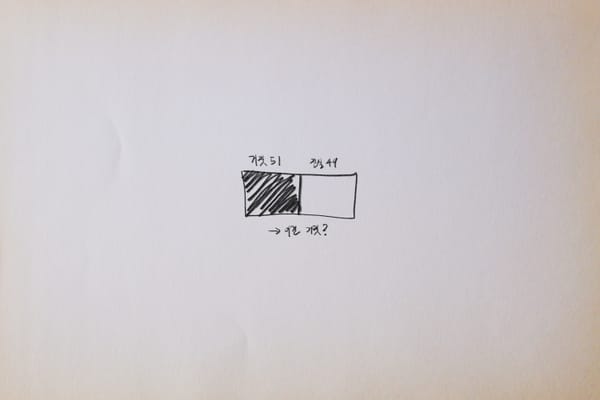중심 기행
인생에도 '중심'이란 것이 있을까. 좁은 보트같은 일상 속에서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는 시간의 바다를 온전히 파악한다는 게 가능할까. 인생이 이 바다 위의 여정이라면, 여정의 중심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
몇 년 전에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다. 당시의 순례길엔 내 또래의 한국인이 많았다. 우리는 굳이 여기까지 와서 걷는 이유를 서로 물으며 친해졌다. 모두 크고 작은 실패를 이유 삼아 여행을 하고 있었고, 그 실패들 중 단번에 이해가 가지 않는 실패는 없었다. 외국에서 떠도는 것은 실패가 흥행하는 시대에 따라붙는 일종의 유행 같았다.
거기서 같이 걷느라 친해진 친구들이 있다. 둘은 신혼부부였다. 둘 다 별다른 대책도 없이 회사를 관두고 가진 돈을 다 털어서 왔다고 했다. 아주 지랄맞은 상사를 만나서 더 견디고 싶지가 않았다고, 그러던 찰나에 TV에서 여행하는 예능을 보고 그냥 떠나와버렸다고 했다.
둘은 나보다 나이는 조금 더 많았지만 여러모로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었다. 한 쪽은 물집이 잘 잡혀서 내게 반창고며 바세린이며를 빌려 갔고 한 쪽은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장보기를 어려워했다. 걸음은 느리고, 말은 많은 둘과 함께 몇 주를 같이 걸었다. 저녁은 보통 내 담당이었다. 손 크게 장 보는 걸 좋아하는 내가 고기도 굽고 파스타도 삶고 샐러드도 만들었다. 스페인의 시골에서 함께 찍은 사진은 여행이 끝난 후에도 꽤 오랫동안 우리의 프로필 사진이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둘에겐 아이가 생겼다. 내겐 둘의 프로필 사진을 통해서 아이가 크는 걸 염탐하는 습관이 생겼고. 사진이 바뀔 때마다 몇 번 아는 체를 했었는데, 지난 주말엔 아는 체에 대한 답장으로 부산으로 나를 초대해줬다.
부모가 된 둘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되어있었다. 능숙하게 우는 아이를 달래고 분유를 타 먹이고 기저귀를 갈면서 출근 준비도 한다. 새벽에도 자지 않고 낮에도 졸지 않는 젊은 부모는 아이가 잠드는 그 짧은 평화의 순간마다 내게 스페인 이야기를 하러 온다. “우리 그때 진짜 젊었다 아이가” “그때 진짜 좋았다” “니는 힘들다고 신발도 집어던져놓고 뭘 좋았다하는데.” 아이가 깨기 전까지 우리는 목소리를 낮추고 시간 여행을 한다. 그때도 지금도 말이 별로 없는 나는 투닥대는 둘에게 우물쭈물 대다가 그래도 지금 참 좋아 보인다는 인사를 겨우 건넨다. “맞나. 맞다. 그래도 지금 모든 게 순리대로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무사히 밥도 먹고 트림도 한 아이는 잠들었다. 아이가 내는 숨소리는 사람이 내는 소리라기보단 생명 그 자체가 내는 소리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옆방에서 소곤소곤 옛날 생각을 하던 젊은 부부의 말소리도 이내 졸아든다. 소독된 주방의 식기들이 정오의 햇볕을 받아 빛나고 있고 도시의 소리는 아주 아주 멀게 들린다. 바깥에선 분명히 사람들이 나름의 중요한 일로 시끄럽게 굴며 무진장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겠지만 지금 이 시공간은 바깥의 바쁨으로부터 완벽히 등을 돌리고 있다. 지금, 여기가 아마 이 가족의 중심일 것이다. 생의 중심에 초대받아, 그 시간을 대접받은 손님에겐 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날 새벽엔 침대 머리맡에 달린 카메라를 믿고 대담한 모험을 떠났다.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고깃집에 가서 같이 삼겹살을 구워 먹기로 한 것. 둘은 사장님을 포함한 가게의 모든 사람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사장님은 밑반찬이며 고기며 볶음밥이며 내올 때마다 애는 잘 있나 하며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 보고 젊은 부부는 그럴 때마다 나를 귀한 손님이라고 소개하며 동문서답을 한다. 핸드폰 화면 속 아이가 뒤척일 때마다 둘 중 하나는 고기를 먹다 말고 뛰쳐나간다. 고깃집의 모든 사람들이 참 좋은 세상이다 하며 웃는다.
고깃집 수저 통에 기대둔 핸드폰 화면 속에 젊은 아빠가 등장한다. 아이를 안는다. 둘의 눈동자가 검게 반짝, 빛난다. 핸드폰 화면을 보고 웃는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술잔을 채운다. 화면 속의 그이가 다시 테이블 앞에 앉길 기다려야 하므로 ‘짠’은 잠시 미뤄둔다. 고깃집의 사람들이 젊은 아빠가 아이를 어떻게 다시 재우나 보려고 화면 앞으로 모여든다. 모두의 불콰한 얼굴에, 세월마저 씻어내리는 미소가 번진다.
Credit
글 | 야백
그림 | 야백
발행일 | 2024년 1월 3일
*이 에세이는 풀칠레터 167호 :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에 실린 글을 일부 수정해 재업로드 한 글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다른 필진의 코멘트도 같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풀칠레터 167호 :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다른 이야기도 읽어보고 싶으신가요?
풀칠레터를 구독해 주세요.
매주 수요일 자정, 평일의 반환점에
새로운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Copyright ©풀칠 All Rights Reserved
읽는 마음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