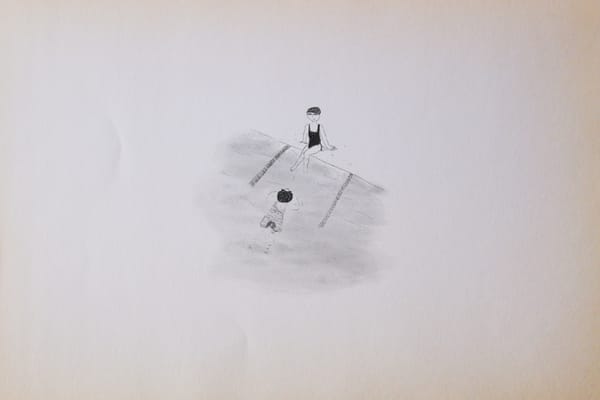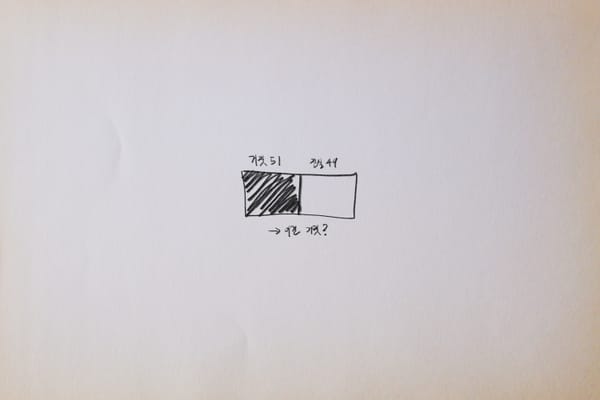혼자 걷는 골목은 하나도 쓸쓸하지 않고
부평 살이도 일 년이 훨씬 넘었다. 서울로 오가는 1호선은 못해도 500번쯤 타지 않았을까. 지하철에서 하는 일이라곤 음악을 듣고 스마트폰 스크롤을 내리는 것뿐이다. 그러니 내게 서울과 인천 사이는 흘려 보내는 시간으로만 존재했다. 신도림, 구로, 개봉, 역곡, 부천, 송내… 그 이름들은 구체적인 풍경이 아니라 단지 ‘부평까지 남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식에 지나지 않았다.
한 시간 넘는 귀갓길을 혼자 조용히 보내는 일은 외딴 섬에 들어가는 의식과도 같았다. 지하철을 타고 간 끝에서 부평의 풍경을 맞이하며 느꼈던 정서는 <설국>의 유명한 첫 문장에 담긴 그것과 비슷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마치 광장에서 밀실로 몸을 구겨 넣는 과정을 느리게 재생한 듯 보이기도 했고, 청소를 끝낸 로봇청소기가 충전기로 돌아가는 모습 같기도 했다.
2019년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1301명에게 출퇴근 소요 시간을 물었다. 거주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는데, 평균적으로 경기도는 134.2분, 인천은 100분, 서울은 95.8분이 걸린다고 한다. 수도권 직장인은 하루 평균 114.5분을 출퇴근에 쓰고 있는 것이다(비수도권 직장인은 59.9분). 대충 이 수치를 반으로 나누면 퇴근 소요시간이다. 나는 경기도 평균에 가깝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정서까지 평균일까. 긴 퇴근 시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겠지만, 그보다는 그렇게까지 해서 돌아간 동네마저 낯선 곳이라는 사실이 쓸쓸한 정서를 더 크게 만들었다. 아는 길도, 장소도, 사람도 전무한 곳에서 보내는 일상은 지겨운 여행이었다. 설렘은 사라진 지 오래고, 여독만 켜켜이 쌓이는. 집은 그저 불편한 잠자리였다. 불 끄고 누운 방은 침대만큼 좁았고 우주만큼 고독했다.
얼마 전 처음으로 인천행 지하철에 누군가와 함께 탔다. 차라리 친한 사이였다면 각자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스마트폰을 보며 갠플했겠지만 그와 나는 약간의 거리를 둔, 그만큼의 예의를 차려야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조용조용 대화를 이어갔다. 요즘 하는 일은 어떤지, 오늘 본 전시가 어땠는지, 저번에 읽은 책이 얼마나 읽기 힘들었는지, 여름 휴가를 어떻게 했는지 등등등.
새삼 지하철 내부가 이렇게 조용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들리는 거라곤 차량이 덜컹거리는 소리와 대화를 나누는 우리 목소리뿐이었다. 옆자리인지라 고개를 돌려 그를 보기도 애매했고 스마트폰을 볼 수도 없으니 정면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반대편 의자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이, 차창 밖 풍경이 보였다. 안 들리던 것이 들리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경험. 시간만 있던 퇴근길에 공간이 들어왔다.
그가 내린 바로 다음 역이 내가 내릴 역이었다. 작별인사를 하고 겨우 몇 분 뒤면 나도 집에 도착하는 것이다. ‘외딴 섬에 들어가는 의식’이라며 심각한 얼굴로 고독을 씹기엔 지나치게 짧은 시간. 굳이 그 비유를 통해 말하자면 난 여전히 육지에 머물고 있는 셈이었다. 어딘가에 연결돼 있다는 감각이 끊이지 않고 유지됐다. 부평역에서 집까지 “혼자 걷는 골목은 하나도 쓸쓸하지 않”았다.
사실 대부분의 퇴근길에 나는 여전히 혼자다. 새로 나온 노래를 들으면서 전자책을 읽는 게 퇴근길 루틴인데, 그 와중에 2호선을 타고 가면서 몇몇 지인과의 카톡 대화방을 열어 저녁이나 먹자고 연락할까 말까 망설인다. 그러니까 신도림역에서 19시 8분에 출발하는 동인천행 특급 열차를 타기 직전까지. 물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귀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다.
다만 그 날 이후로 부평이라는 공간을 달리 인식하기 시작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감각을 여기서도 어렴풋이 느끼게 됐다. 마음가짐이 안정되니 그제서야 이 도시에서도 일상이 보였다. 찰나였지만 돌아보니 건 분명 내 인생의 챕터가 넘어가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게다가 일상성의 낙수효과랄까, 이제 별다른 약속이 없을 때는 집에서 빈둥거릴 줄도 알게 됐다.
“아매오 님은 올해가 끝날 때 본인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올해 초 한 모임에서 서로의 새해 다짐이나 바람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내게 돌아온 물음에 뭐라고 답했는지 아직 생생하다.
“서울과 부평을 일상으로 느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딜 가든 여행자의 마음이 들거든요.”
다짐보다는 차라리 바람에 가까웠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내 일상을 구성하는 시간 중 가장 별로라고 여겼던 시간, 퇴근길이 준 선물이었다.
Credit
글 | 아매오
사진 | 아매오
발행일 | 2020년 9월 23일
*이 에세이는 풀칠레터 11호 : 혼자 걷는 골목은 하나도 쓸쓸하지 않고에 실린 글을 일부 수정해 재업로드 한 글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다른 필진의 코멘트도 같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풀칠레터 11호 : 혼자 걷는 골목은 하나도 쓸쓸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도 읽어보고 싶으신가요?
풀칠레터를 구독해 주세요.
매주 수요일 자정, 평일의 반환점에
새로운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Copyright ©풀칠 All Rights Reserved
읽는 마음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